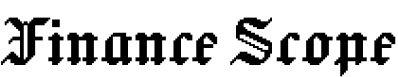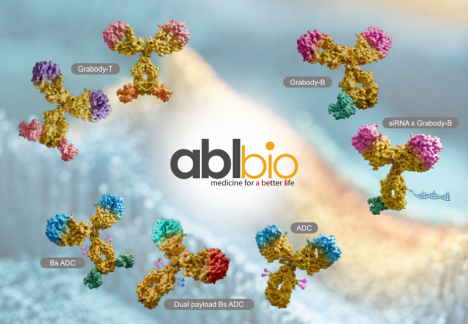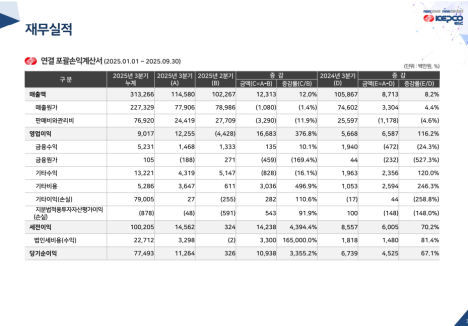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5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업계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른 미국 시장 리스크를 점검했다.
리스크 점검 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 호텔서 진행됐으며, 이 에너지정착실장을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 및 수출입은행, 스마트그리드협회, 신한자산운용,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ESS 수출 1위 시장으로, 향후 10년 동안 총 770 GWh 이상의 ESS가 설치되며 연평균 25%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성장성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증가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 미 수출액은 ▲2022년 9억7000만달러(약 1조3800억원) ▲2023년 17억5000만달러(약 2조4900억원) ▲지난해 21억9000만달러(약 3조1200억원)를 달성하는 등 ESS용 배터리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 대 미 수출액은 ▲2022년 14억2000만달러(약 2조원) ▲2023년 16억5000만달러(약 2조3500억원) ▲2024년 4억5000만달러(약 6400억원)를 기록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관세조치로 10%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추가 15%의 상호관세가 예정 돼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를 비롯한 기업·기관은 한국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정책 금융 제공 등 지원 방안을 건의했으며, 정부는 코트라․무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업계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ESS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전력시장에서의 차익거래 등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ESS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만큼 우리 ESS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국내 ESS 산업 생태계를 재정비하는 'ESS 산업 발전전략'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ESS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출력제어 빈도가 많은 제주-호남을 대상으로 500MW급 BESS 중앙계약시장을 추가 개설할 계획임을 밝혔다.